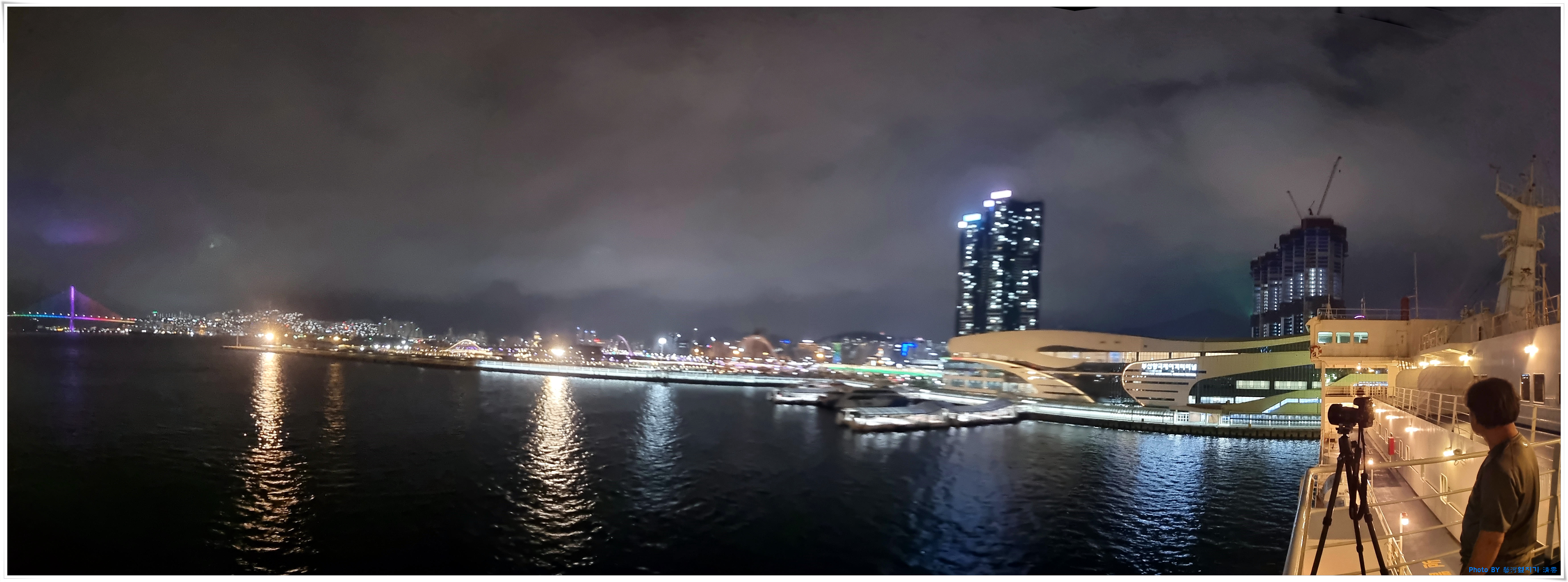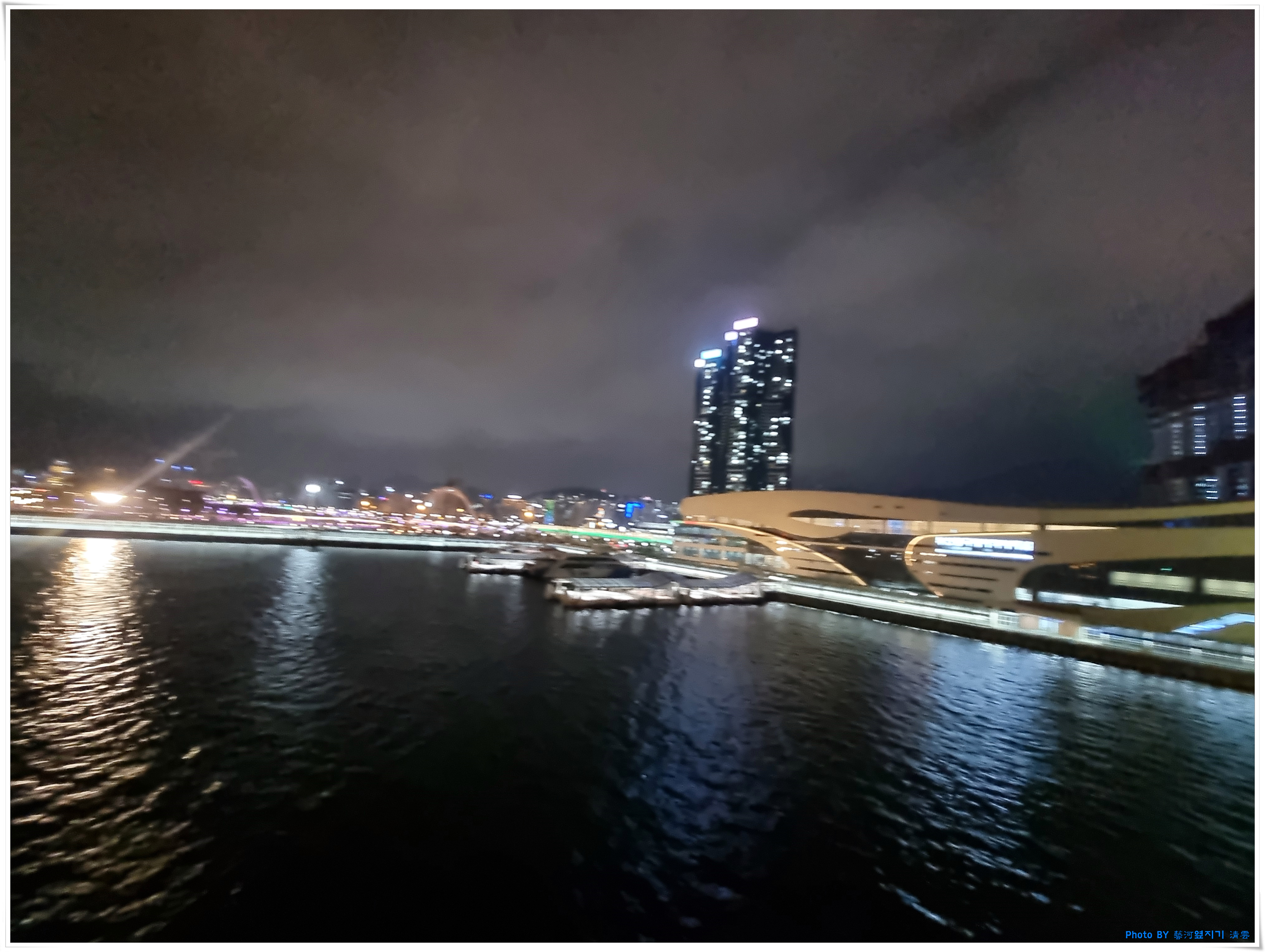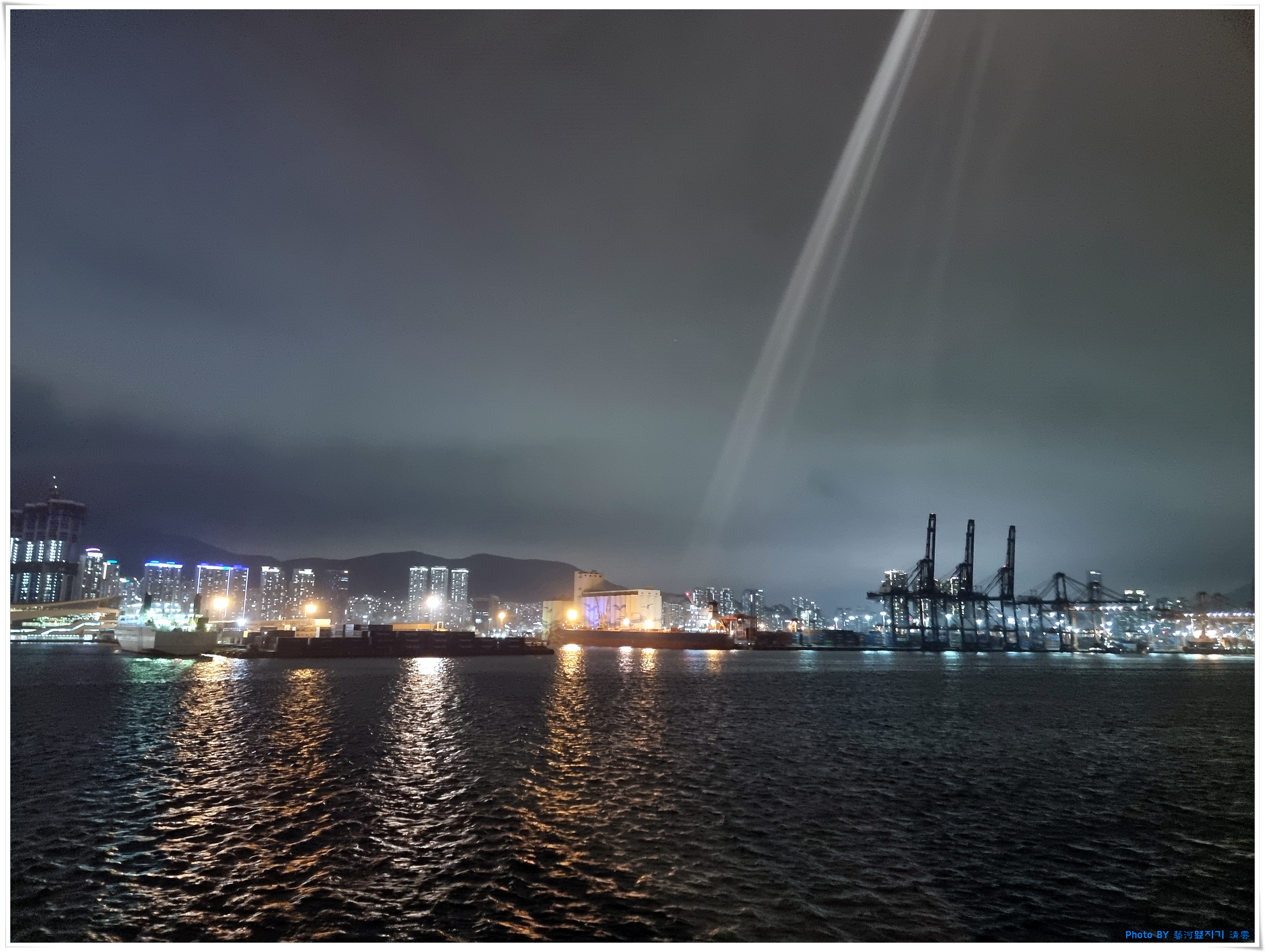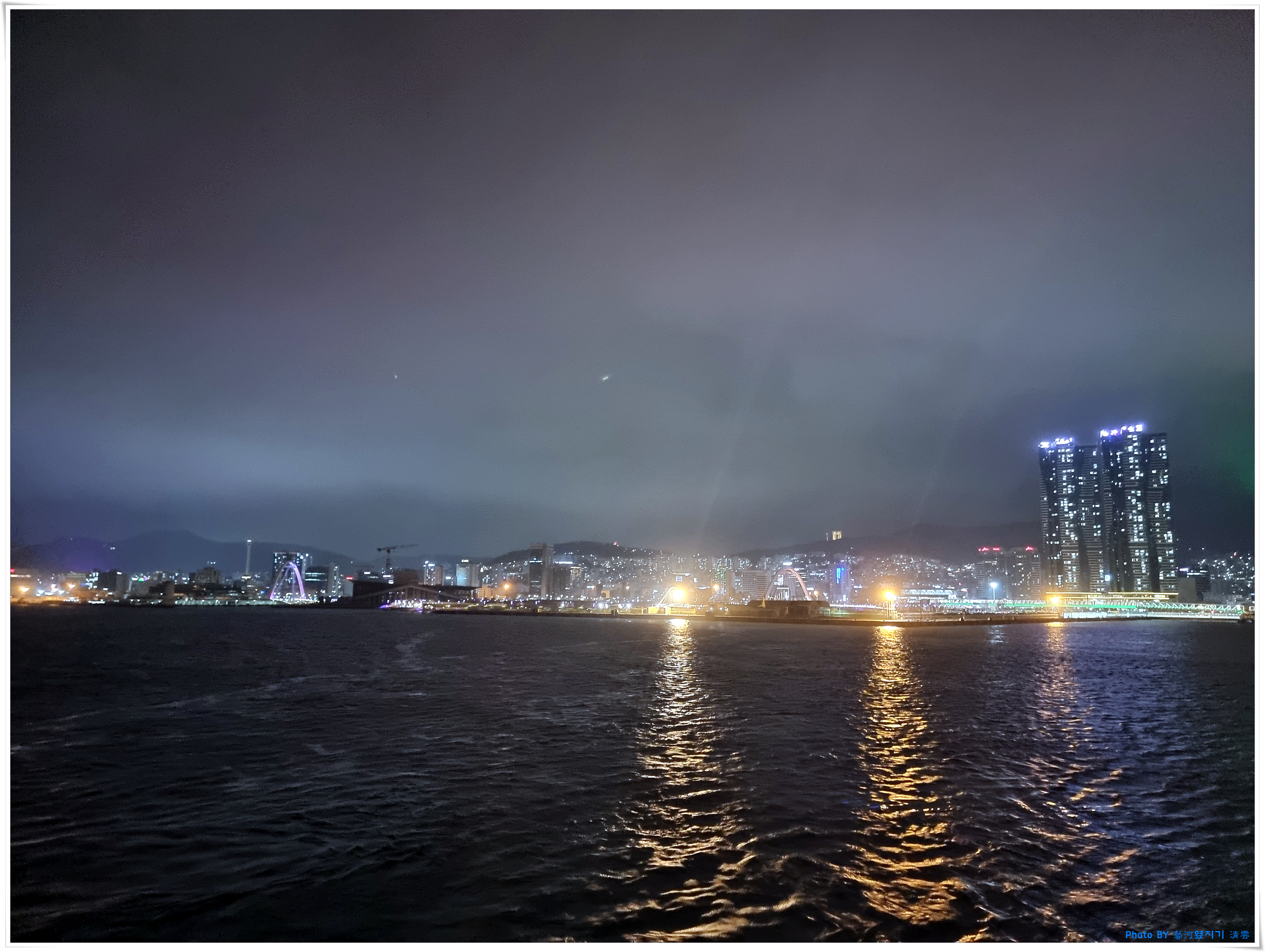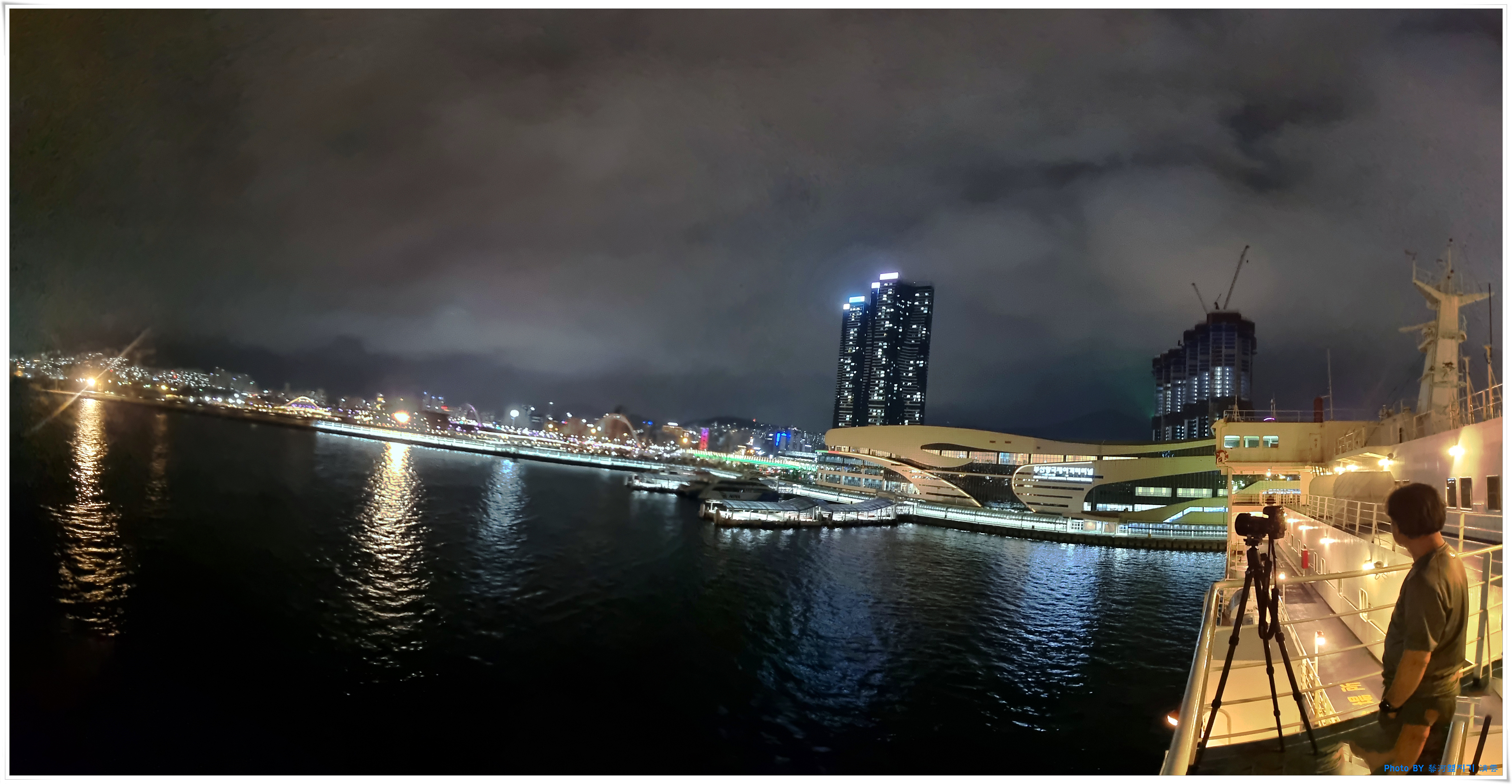"물건도 물건같지 않은 것얼 휘두르고 댕길 때 내가 밤마동 얼매나 눈물얼 흘린 줄 아시요?
어쩌다 집이라고 들어와서는 쑤시지도 못헐 물건을 가지고 이년얼 얼매나 환장허게 맹근 줄 아시오?
첨부터 색얼 몰랐다면 모를까, 한번 알고 난깨 몸뎅이가 저 혼자 지랄발광얼 떠는 것얼 못 참겄습디다.”
“임자도 색골언 색골이구만.”
“한번만이라도, 단 한번만이라도 살방애럴 실컷 찧어보변 원도 한도 없을 것 같앴소.
헌디, 저 놈언 아새끼 잠질망정 탱탱헐 때넌 다른 년 좋은 일만 시키고,
나 잡아묵소, 허고 고개 팍 숙이고 있을 때만 내 속곳얼 내렸소.
허니, 그때마다 이년이 얼매나 환장했겄소. 하루에도 열두번씩 저 놈얼 버리고 도망가고 싶었소.”
음전네가 살집으로 강쇠 놈의 거시기 놈을 갉작거리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긍깨, 멋이냐? 시방 정사령헌테 보개피럴 허는 것인가?”
“보개피도 아니요. 정말 보개피럴 헐 생각이었다면저 자구럴 내버려놓고 야반도주라도 허는 것이겄제요.
지랄났다고 똥오줌 수발에 더런 몸뎅이럴 씻겨줌서 쌩고생얼 허겄소. 아, 심 좀 팍팍 줘보씨요. 미치고 환장허겄소.”
음전네가 아랫녁을 풀쩍거리며 안달을 했다.
“그까? 팍팍 해뿌리까?”
“아구창이 나도 존깨 심껏 해보씨요.”
“흐면, 글제, 머.”
강쇠 놈이 눈을 질끈 감고 이년아, 죽어봐라, 죽어봐라, 하고 중얼거리며 엉덩이를 깝죽거렸다.
음전네가 비릿하고 달콤한 냄새를 내뿜으며 죽겄소, 나 죽겄소, 좋소, 좋아 죽겄소, 아으아으, 하고 비명을 내질렀다.
그러거나 말거나 강쇠 놈이 허리 운동만 죽어라고 해댔다.
조금이라도 빨리 음전네를 죽여놓고 정사령 놈의 눈길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냥이라도, 음전네가 반내내 허벅지를 꼬집건, 덜 식힌 몸둥이 때문에 방바닥이 닳도록 뒤척이건,
얼음물에 멱을 감건 상관하지 않고 도망을 가고 싶었지만,
그것은 안 되요, 하고 고개 빳빳이 쳐들고 있는 거시기 놈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다.
기왕에 만나 시작한 일이니까 거시기 놈도 재미난 꼴을 보아야하는 것이었다.
놈이 제 스스로 고개는 숙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주인 된 도리였다.
얼마나 살방아를 찧었을까.
음전네의 입에서 아으윽하는 비명이 쏟아져 나오더니, 몸에서 힘이 빠져벼렸다.
“그만. 그만 허씨요. 날 좀 살려주씨요.”
음전네가 울음을 터뜨렸다.
“나넌 안직도 멀었구만. 기왕에 시작했는디 끝장얼 봐뿐져야제.
허다가 말면 요놈이 저녁내 나럴 잠 한숨 못자게 헐 것이랑깨.”
강쇠 놈이 더욱 힘을 주어 살방아를 찧어댔고 음전네가 눈물반 콧물반으로 꺽꺽 울었다.
그러다가 숨이 컥컥 막힌가 싶더니, 고개를 한 쪽으로 떨어뜨렸다.
그러건 말건 강쇠 놈의 방아고질은 한 식경 남짓이나 계속되었다.
그래도 거시기 놈은 지칠 줄을 모르고 더욱 왕성하게 살아날 뿐이었다.
‘야이, 썩을놈아. 인자 그만 좀 허자. 오널언 왜 싸도 않고 뻣뻣허냐?’
강쇠 놈이 거시기 놈을 나무래다가 정신을 퍼뜩 차리자 다시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온 몸에 소름이 솟았다.
‘거참, 별 일이시. 저녁에 내가 왜 이런다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음전네를 내려다 보니, 계집이 고개를 한 쪽으로 쳐박고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다.
‘어? 이 여자가 숨줄얼 놓은 것이 아닌가?’
강쇠 놈이 얼른 음전네의 몸에서 내려와 콧구멍에 손가락도 대보고 가슴에 귀도 대보았다.
다행이 가느다란 숨결은 남아있었다.
‘흐참, 송장 치루는 줄 알고 십년언 감수했네.’
강쇠 놈이 한숨을 휴 내쉬고 서둘러 옷을 입었다.
바지를 입고 저고리를 걸치면서 흘끔보니, 정사령놈이 눈을 번히 뜨고 바라보고 있었다.
“미안시럽소. 허나 어쩌겄소? 다 당신이 자초헌 업보인 것을.”
강쇠 놈이 중얼거리다 말고 둘둘 말린채 한 쪽에 몰려있는 이불자락을 펼쳐 음전네의 몸둥이를 가려주고 방을 나왔다.
그래도 음전네는 꼼짝을 못했으며 아니, 강쇠 놈이 방을 나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마당으로 나오자 지리산을 불어내려 온 바람이 온 몸을 감싸고 돌았다.
순간 숨이 컥 막히면서 가슴이 오그라 들었다.
‘흐, 날씨 한번 지랄겉이 춥네이.’
강쇠 놈이 중얼거릴 때 방안에서 으으으하고 내뱉는 정사령 놈의 신음이 흘러 나왔다.
다시 등골이 오싹하면서 온 몸이 으실으실 떨렸다.
‘기분 참 더럽구만이. 내가 음전네럴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는디.’
혀를 툭 차다가 침을 퉤뱉고는 걸음을 빨리했다.
‘흐흐, 박가 성님언 오랫만에 살방애 한번 잘 찧었을랑가?
괜히 주모 아짐씨의 문전만 더럽혔다고 쬐껴나지는 않았을랑가?’